상세보기
이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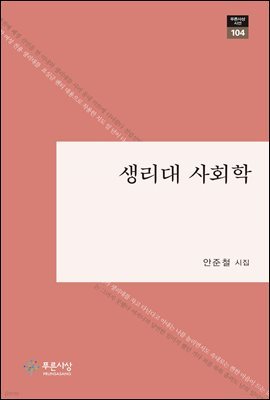
생리대 사회학
안준철 저
푸른사상
- 분야
- 아카데미 > 인문계열
안준철 시인을 처음 알게 된 건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1992)라는 시집을 통해서였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생일마다 써주었던 축시를 모은 시집이다. 안준철 시인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 다니다 뒤늦게 다시 사범대에 편입하여 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만큼 교직에 대해, 그리고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 애정이 남달랐다. 제자들의 생일 축시를 일일이 써주게 된 건 그런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 역시 오래도록 교사 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생일 축시 같은 걸 써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토록 괴로운 세상에 태어난 건 저주(?)받을 일이지 축하받을 일이 못 된다는 게 내 알량한 생각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를 쓰는 동안에도 나는 줄곧 긍정보다는 부정의 정신을 벼려온 편이다. 그게 불의와 모순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는 방편이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여겼다. 그에 반해 안준철 시인은 줄곧 긍정과 낙관의 세계를 일구어 왔다. (중략) “절망은 희망의 밥”이라는 저 낙관의 힘이 안준철 시인의 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시인이 “진실만이 희망”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없다면 시도 없다는 것이 안준철 시인의 지론이다.(중략) 안준철 시인은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비록 말 못 하는 꽃 한 송이일지라도. “눈이 유난히 큰 꽃망울 하나가/나를 빤히 쳐다보”는 모습에서 시인은 꽃이 자신을 환대하는 마음을 본다. 또한 「이월이의 반가사유」에서는 장모님 댁의 강아지 이월이가 자신을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역시 환대의 자세를 읽어낸다. 환대를 받으면 그만큼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건 그리 어렵거나 큰일이 아니다. 같이 마주 보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환대의 마음을 나누는 것 아니겠는가. 환대란 그렇게 상대를 자신의 눈과 마음 안에 모시는 일이다. 식물이나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대 사람을 대하는 일은 또 어떻겠는가. ― 박일환(시인) 해설 중에서

